멀대, 동대산 쟁암당에서 가는 봄을 막아 서다!
봄 기운이 막 몰려 올 때다. 겨울이 혼자 가지 않듯이 봄도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해마다 같이 다니는 아지랑이, 꽃들, 풀과 나무들과 새들이 도반이다. 봄은 늘 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하고 함께 온다.
나도 봄의 허리를 부여 잡고 산 그림자와 함께 바람처럼 찾아 왔다. 영덕 동대산 기슭 아래 쟁암리! 마을 명패에 爭岩里라 쓰여져 있으니 바위를 다투는 곳이다. 혹은 다투는 바위들이 있는 마을로도 해석이 된다. 이름의 유래가 없지 않을 듯 싶지만 그걸 톺아보는 건 풍류를 모르는 한미한 서생이나 할 짓이다. 지금은 일상을 잠시 던져두고 온전히 봄기운에 취하려고 왔지 않는가? 금강산 구경이 식후경이라면 동대산 구경은 酒情에 취하고, 인정에 취하고나서다. 찰나일지언정 봄의 갈피에 들어서 시름을 잊으려고 온 곳이 동대산 안골 쟁암리가 아닌가!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쟁암리! 이 터가 고등학교 친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자고로 땅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동대산에서 흘러 내리는 산자락들은 가파르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도 변덕스럽게 굴곡지지 않고 나이 든 이의 긴 숨결처럼 느릿하게 흐른다. 들도 찰진 기가 감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도 이곳의 지세처럼 사람됨이 각박하지 않고 후덕지다. 친구들이 모일 때는 다 소이연이 있는 법이다.
첫날 밤, 먼저 와 있는 서울 친구들과 함께 몇 순배가 돌자 포항해서 어둠을 밝혀 또 다른 친구가 달려 왔다. 반갑기가 허기진 배에 들어오는 곡기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어느덧 4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이런 길지에서 친구들을 보는 것도 예삿 일이 아니다. 뒤돌아 보면 아득한 그 시절, 기억의 편린들이 빛바랜 흑백사진처럼 어슴프레 할 즈음, 지난 얼굴들의 실루엣이 휘감겨 오는 밤이다.
간밤의 숙면 탓인지, 아니면 길손의 오랜 습 때문인지 일찍 눈이 떠졌다. 방안에서부터 공기가 도회와 사뭇 다름을 느낀다. 아침해가 아직 힘을 받기 전, 새벽에 일어나자 마자 나는 찰리 채플린의 시선으로 담너머 자두나무의 꽃망울을 준비하는 봄의 전령사들과 눈을 맞춘다. 꿀모닝! 그런데 기이하고도 신기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눈앞에서 마술처럼 펼쳐진다. 첫 인사 후 단 4~5시간 만에 수줍은 새악시 볼이 터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북쪽 편의 작은 냇가를 따라 나 있는 우사 안 소들은 또 밤새 안녕하신가요? 이태 남짓 돼 보이는 중 소 두 마리와 한 해가 안 돼 보이는 아이 소 한 마리, 모두 다가서는 나를 보고도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다. 경계의 눈빛이라곤 전혀 없다. 되려 "자네 오는가"하고 친구를 반기듯이 소들이 혀를 연신 낼름 낼름 거리며 내 손등에, 내 팔에 감겨 온다. 아이가 부모의 하는 걸 닮듯이 소들도 주인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요즘 소들은 인간들이 잡아 먹을 "명품용"으로만 길러지다 보니 고된 농사일이 면제되서 그럴까? 아무튼 소들이 사람을 반기는 걸 보니 이곳 사람들의 품성도 그런 모양이다.
나는 바람 같이 갔다가 이슬 맞은 풀잎처럼 누웠다가 아침해를 맞는 나팔꽃 같이 일어나 람보처럼 돌아왔다. 가까운 미래에 다시 멀대의 고질병인 역마살이 일 것이라는 예감을 남겨 둔 채! 나는 거함이 자유로운지라 언제든지 동하면 다시 찾을 것이다.
촌음 같은 시간이었지만, 먼저 묵고 간 친구들이 하나 같이 봄기운과 함께 동대산 정기를 흠뻑 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두 고교 시절의 역부역강한 청년으로 되돌아 갔기를 希願한다.
내게 동대산은 필히 봄이 가기 전에 올라봐야 할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처럼 느낀다. 동대산에 올라 "태산에 오르고 난 뒤에야 천하가 작다는 걸 았았다"(登泰山而小天下)라고 한 공자의 호연지기를 체현해보고 싶다. 머잖아 동대산에 오르고서야 동해가 작다는 걸 알리라! 쟁암당이야 길손에게 마음의 플래폼으로 자리하지만, 자기자신도 믿기 힘든 이토록 복잡한 세상사에 이 봄이 지나면 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겠는가? 수가 영 없는 건 아니다. 봄을 잡아 붙들어 매어놓으면 된다. 길손들이 다 떠나고 없으니 나라도 가는 봄을 막아 선다! 봄아 가지 마소고마!
2021. 3. 24
동대산 안골 쟁암리에서 초고
4. 7. 14:35 완고
雲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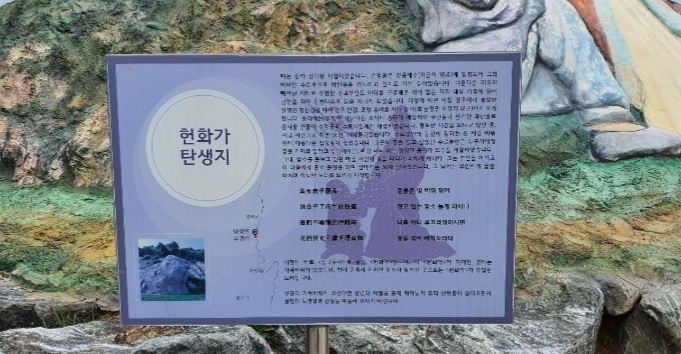


'왜 사는가? > 여행기 혹은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옛정취가 사라진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0) | 2021.05.07 |
|---|---|
| 선친의 젊은 날 낭만이 서린 옥산서원 (0) | 2021.05.07 |
| 대만의 국보급 가수 등려군(덩리쥔) 묘소를 찾아서 (0) | 2021.03.14 |
| 제주여행⑤ 4.3사건 기념관 견학 : 모든 역사는 새로 쓰는 현재사다! (0) | 2021.02.26 |
| 제주여행③ 빛의 벙커 : 빛으로 만난 고흐와 고갱 (0)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