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殺生戒’와 전쟁의 영원한 이율배반 : 불교의 전쟁관과 국방관
서상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무릇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종지로 내세우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천도교 등의 보편종교는 적개심, 파괴, 살상이 수반되는 전쟁과는 이율배반적 관계에 있다. 보편종교가 살아 평화를 지향하고, 죽어 “영생”(eternal life)이나 “열반”(Nirvana)을 희구하면서 살생을 부정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것임에 반해 전쟁은 오직 상대를 죽여야만 자신이 살게 되는 상극적 관계 속에서 살생이 용인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영생”과 불교의 “열반”은 모두 인간이 사후에 도달할 구극적 가치와 목적을 표상한다. 그렇다고 두 종교가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인간의 현재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천국과 피안의 도달을 위해 더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것과 이 사회를 긍정하도록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의 세계와 국가의 유지, 사회의 질서와 인간의 도덕률을 필요로 하고, 이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러한 보편 종교다.
그런데 종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 혹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과 전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증오에서 비롯된다. 역사상의 전쟁은 모두 제각기 명분과 동기가 있었지만 약 90%가 종교와 관련돼 발생했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가 오히려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쟁의 발생방지가 바람직한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것이 인류역사였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필요성에서 군대와 무력을 보유,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 보유의 필요성과 예비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한 군대의 수요는 항속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를 믿든 신자와 성직자에게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과 군사적 메카니즘의 상호 배타적 ‘부조리’가 질곡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 때문에 군 병역의무를 행하는 한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군입대에 대해 고민하거나 병역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들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 절대시하여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형법에 저촉, 복역하는 자들도 적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종교를 믿거나 그 성직자라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과 군이 가지는 공인된 국가 폭력의 메카니즘에 대한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불교윤리의 측면에서 보면 승려가 입대한다는 것, 즉 승려가 군인이 된다는 사실은 가사 대신 군복을 입고 총을 들어야 하며, 채식 대신 육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불교계율의 핵심 가르침을 정면에서 거스른 것이고, 보살(Bodhisattva)의 서원과도 배치된다. 왜 그런가? 이 의문은 불교가 살상이 정당화되는 전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에 맥이 닿아 있다.
그렇다면 불교는 전쟁과 국방문제를 어떻게 볼까? 불교는 대량살상이 용인되는 전쟁을 정당하게 보는가? 전쟁은 분명 불교계율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와 국가권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양자의 관계를 축으로 소승불교(Hina-yana), 대승불교(Maha-yana)로 전개된 불교발전의 역사적 궤적을 따라가 보면 부처의 가르침이 인도를 넘어 중국,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불교의 불살생관과 전쟁관이 어떻게 재해석돼 왔는지 알게 된다. 병역의무와 관련해 크게 고민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그들은 이 글을 통해 불교와 국방의 상호 回向의 당위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불교는 개인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고, 그것의 구극처로서 부처의 경지, 곧 시공간적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 不生不死의 상태인 해탈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종교다. 인간은 정치와 동떨어져선 인간사회 내에서 삶의 영위가 불가능한 정치적 동물이듯이 불교도 이승의 사바세계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불교가 해탈을 위한 방편으로 출세간을 지향하고 세간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고 해서 국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정치와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출세간이 지향하는 바가 대승적 차원의 ‘上求菩提, 下化衆生’에 있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인도의 원시불교시대 국왕의 발생을 언급한『長阿含經』에서 불교도들은 국왕을 넓은 의미의 고용인으로 생각했다. 국가 즉, 왕의 출현은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인간의 타락을 불가피하게 만든 하나의 단계라는 것이었다. 정부라는 제도도 인간이 타락한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으로 보았다. 또한 국가지배자의 역할이 공공질서의 유지에 한정되는 경찰국가의 개념과 연결돼 있다. 그 사회적, 정치적 원리는 인류의 생물학적인 평등을 시사하고 있다.
부처는 브라만(Brahman) 위주의 계급사회를 부정하고, 생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서 동일한 가족으로 보았다. 고대 인도사회의 밧지국, 말리족과 부처, 즉 역사적 인물로서의 고타마 시타르타의 일족인 석가족은 모두 공화제 형식의 부족국가 내지 연합국의 형태로 운영됐다. 반면 코살라국, 마가다국 등은 전제국가였다. 당시 이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의 본분은 백성을 돌보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었다.『大乘大集地藏十輪經』제5권에는 “모든 국토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돌보며, 자국을 수호하고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왕의 임무라고 밝히고 있다. 고대 인도사회에서 불교적인 정법의 통치로 모범을 보여준 아쇼카(Asoka, B.C.?~232?) 왕은 국왕의 역할과 관련해 전륜성왕과 부처님의 역할은 동일하다고 역설하면서 모든 왕에게 전륜성왕이 되라고 권했다. 국왕은 모든 힘을 기울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전쟁발생을 억제하고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불교가 지향하는 정치는 正法에 의한 통치다. 정법이란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다. 그 세계는 평화로운 불국토로서 계율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戒(Sila)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내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理法으로서의 지침이다. 律(Vinaya)은 계의 토대위에서 승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위적 규범이다. 이를 위해 불국토 건설이 불교의 더 없는 목표가 된다.
부처님의 출가동기도 인간들의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고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세계가 바로 불국토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인도 카필라국의 태자 신분을 던져버리고 출가한 동기도 인간들의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불국토에 살게 하겠다는 서원 때문이었다.
그런데 평화로운 불국토 건설은 아힘사(ahimsa), 즉 비폭력이 전제돼야 한다. 비폭력은 불살생을 의미하고 곧 평화상태의 지속을 말한다. 불교에서 불살생을 논의할 경우 우리가 다루는 것은, 생명으로 간주되지 않는 ‘名’(nama)인 識(gandhrva, 中陰神)이 없는 ‘無情’에 대해서가 아니라 六道중생(sattva, 有情) 가운데 DNA와 관련된 인간을 포함한 생물 일체에 대해서다.
비폭력의 실천은 자비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비폭력은 자비심이 겉으로 드러난 외화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원한을 버릴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평화가 온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생명의 연기성과 인간죽음의 보편성을 깨달으면 온갖 갈등과 싸움은 사라진다고 한다(『法句經』, 제6절).
부처님의 교설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우주와 삼라만상은 인연으로 얽혀 있는 연기의 세계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소멸한다”는 연기의 세계에서 우리는 나의 미래가 곧 타인의 미래와 불가분의 깊은 관계에 있다고 배운다. 심지어는 미물까지도 모든 생명체가 곧 나의 과거이거나 미래임을 깨닫는다면 남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同體大悲”가 여기서 나온다.
『마하박가』에서 붓다, 즉 부처는 계를 받은 비구는 개미, 곤충, 벌레 등 그 어떤 생명체든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붓다의 불살생 계율은 모든 생명을 존엄시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고, 모든 중생에게 고통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고전적 평화사상이다.
이 평화사상은 범법자를 제거하는 의로운 전쟁을 통해 세계의 질서(法, dharma)를 보전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다고 말하는『바가바드 기따』(Bhagavadgita)의 가르침과 비교된다. 이 사상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사용을 반대하고 살생을 해선 안 된다고 가르친 부처의 윤리적, 도덕적 실천에 대한 교설로 나타나고, 그 불설의 가르침은 계율의 실천을 통해 증득된다. 이 중 불살생은 5계나 10선계에서 모두 으뜸 계목으로 제시돼 있다. 구족계에서는 살인을 승려를 승단에서 축출할 정도의 중죄에 해당하는 4바라이죄(음행죄, 도둑죄, 살생죄, 거짓말죄)로 치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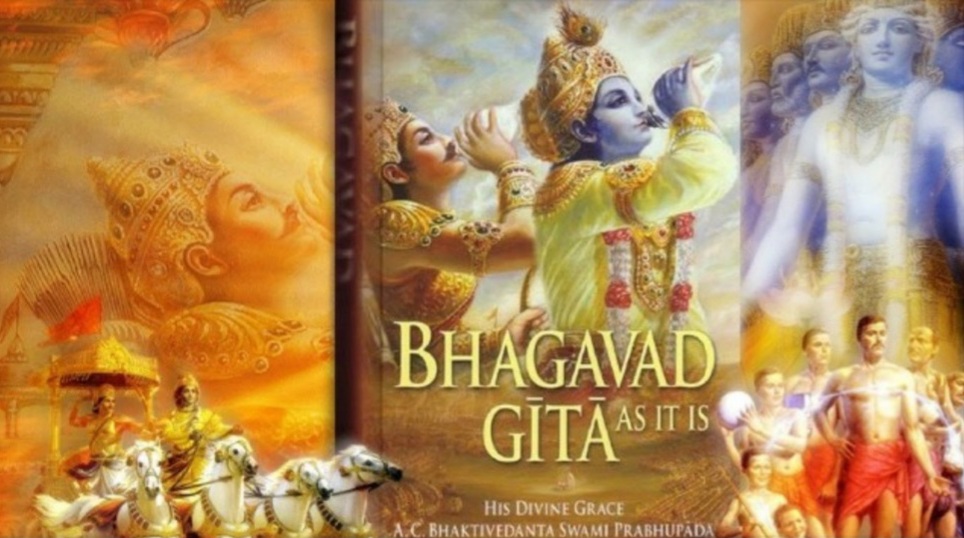
기원전 부처님 재세시의 고대 인도사회에서는 크샤트리아 계급만이 전쟁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승가교단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초기불교 승가의 규정에 의하면, 출가수행자는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을 보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군대 안에 머물러야 할 경우라도 2~3일 동안의 체류는 인정되지만 그때에도 군대의 정렬, 배치, 열병식 등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심지어 일반인들에게조차 무기를 만들거나 거래하지 못하게 했고, 독약 및 마약의 제조는 물론 술의 제조와 동물의 도살까지도 허용하지 않았다.
국왕에게도 전쟁을 포기하도록 권유했고, 국왕의 무저항주의를 찬탄했다(『자타카』Jataka). 실제로 이 시기 인도 각국의 왕들은 국내적으로 온화한 평화정책을 펴려고 노력했고, 밖으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이상으로 삼았다. 초기불교 교단에서는 세속적인 국가권력의 전쟁을 멈추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근린국들 간의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았고, 폭력에 대해서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인욕할 것을 가르쳤다. 부처님의 조국인 카필라국을 여러 차례 침략해온 코살라국 비두다바(Vidudabha)왕에 대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神通제일인 목갈라나(目健連)가 무력으로 대항하자고 건의했지만 부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결국 카필라국이 망하기까지 했다.
부처님이 무기와 전쟁을 언급한 것은 목갈라나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頭陀제일인 마하카삽파(摩訶迦葉)가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정법을 확립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청했을 때 정법을 수호, 확립하기 위해서는 때로 무기사용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한 경우다. 특히 재가신도들은 정법수호를 위해 무기를 사용하여도 계를 어기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설한 바 있다.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는 마땅히 정법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정법을 수호한 과보는 한없이 크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선남자여! 그러므로 정법을 수호하는 신도들은 무기를 가지고 비구를 옹호해야 한다.”
또 “비구가 무기를 지닌 신도들을 친구로 옆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파계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무기를 지니더라도 남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출가자가 직접 무기를 지녀서는 안 되지만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든 재가신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되 제1의 계율인 불상생계는 지키라고 했다.
부처님의 열반 후에 성립된 율장에서 “몽둥이, 활, 칼, 창, 검 등의 무기를 지닌 자에게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듯이 그 이후의 부파불교시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승불교에서도 국가 간의 전쟁도발과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 대해 계율로 엄격히 금지했다. 대승불교의 계율사상을 담고 있는『梵網經』「十重大戒」중 첫 번째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다. 살생이 따르는 전쟁은 애시 당초 용납되지 않았다. 또 같은『梵網經』제11「通國使命戒」에는 “군사를 일으켜 서로 치고 무량한 중생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보살은 군대와 왕래해선 안 된다”고 설하고 있다.
그런데 훗날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에서는 정법수호를 명분으로 전쟁이 정당화됐다. 그 연원은 攝受와 折伏에 있었다. 섭수는 감싸 안고 용서해 보살피는 것이다. 반면 절복은 정법이나 국가를 파괴하는 악을 꺾어 항복시키는 강제적인 수단으로서, 정법을 수호하는 동기라면 침략전쟁은 아니더라도 방어적 전쟁은 용인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4세기 경에 만들어진『勝鬘經』제2「十受章」에는 “내가 힘을 얻었을 때 마땅히 절복할 것은 절복하고, 섭수할 것은 섭수하리라. 왜냐하면 절복과 섭수로써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해져 있다.
절복의 전거라고 일컬어지는 대승경전의『大乘涅槃經』권3「金剛身品」에서도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도 좋다. 그것은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구절에 대해 “무기를 들고, 심지어 목을 베기까지 하는 것이 절복의 뜻”이라고 풀이했다. 즉 현실사회에서 “정법수호”라는 정당한 목적 때문이라면 불가피하게 불살생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인데, 악행을 징계하는 “정의의 전쟁” 및 폭력은 정의롭다는 것이다.
정법과 청정 승가교단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가신도들이 5계, 좁게는 불살생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상은 그 뒤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에서 국가권력과 타협한 승가의 이론가들이 재가신도들에게는 물론 승가교단에게도 ‘호법을 위한 호국전쟁 참여’의 논리를 정당화해주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게 됐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 초기 중국승려들은 인과응보, 업설 등을 근거로 불살생계와 같은 생명존중의 보편적 윤리가치관을 도입해 전쟁이 다반사였던 살벌한 사회의 분위기를 순화하고 정화하는 데 노력했지만 동시에 무소불위의 국왕의 신성이나 국가주의 등의 기존 사회정치체제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러나 살생과 폭력을 부정하고 죄악시 했던 중국승려들이었지만 결국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왕토에 살고 있는 한 그 신민으로서 협조해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위정자의 폭력과 전쟁, 그리고 살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북조시대 불교의 계율, 자비, 인욕 개념에 근거해 비폭력 이념을 제시하면서 부처님의 법이란 살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현실세계에서 교화가 불가능한 악인들은 국가권력이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佛圖澄(232~348)이 그 단적인 예다.
중국불교의 이론가들은 살생과 전쟁에 대한 정당화의 뿌리를 대승불교의 보살도에서 찾았는데, 보살은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 작은 악을 제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경우 불살생계율을 어기더라도 뭇 중생을 구제할 수만 있다면 살생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때 살생은 부처님이 제시한 올바른 길인 正道일뿐만 아니라 살생으로 보살의 몸은 비록 지옥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더라도 악인을 제거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부처가 행위의 의도(intention)를 중시했듯이 정법수호를 위한 동기라면 의로운 살생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즉 악행을 징계하는 “정의의 전쟁”(dharmya yuddha, dharmya sa grama)과 폭력은 정의롭다는 것인데, 같은 계라도 어떨 때는 허락되고, 어떨 때는 금지되는 불교의 ‘開遮法’에 맥이 닿는다. ‘開’, 즉 여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고, ‘遮’, 즉 막는 것은 계를 지킨다는 의미다. 계율을 어겨도 그것이 정당한 상황이라면 용납될 때가 있고, 죽게 되더라도 계율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대승불교권에서 살생과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났다. 평화시에는 세금과 군역면제, 토지와 노비 등의 소유를 통한 경제적 토대의 거대화를 이룬 사찰의 기득권 보호 차원의 반정부 전쟁의 형태로 나타났고, 타국의 침략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호국불교’로 나타났다. 그것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중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趙樸初(1907~2000)가 호국불교론을 들먹이면서 자국민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선동한 것이 좋은 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抗美援朝 保家爲國’을 위한 ‘인민지원군’에 입대해 석가모니께서 자비의 화신으로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고난을 무릅쓰고 인민을 구제하기 위해 적을 죽인 정신을 실제로 배우는 길이다.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미 제국주의를 쓸어 없애는 일이야 말로 불교교리에 충실한 것이므로 아무도 비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덕을 쌓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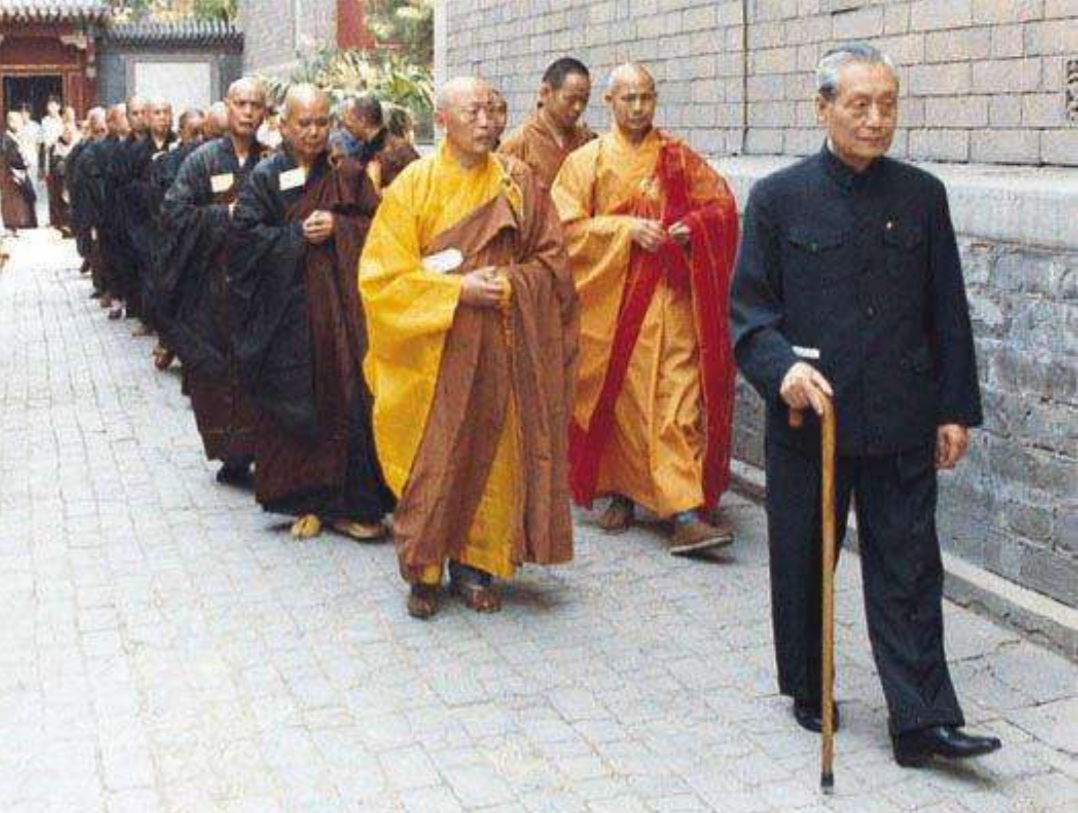
일본은 戰國시대와 江戶시대에 걸쳐 끊이지 않았던 영주들의 압박에 대항한 一向宗, 一連宗 중심의 승려들이 벌인 반영주, 반막부 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승려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조선의 침략전쟁에 참여한 겐소(玄蘇, 1537~1611), 弸中, 安心 역시 승려들이었다. 특히 대마도주 소우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의 고문으로서 조일 교섭에서 일본 측 사자역할을 맡았던 겐소는 일본의 조선침략에 앞장서 조선을 유린하는 데에 일조한 요승으로 일컬어 졌던 인물이다.
전래와 동시에 국가 혹은 국왕의 공인을 받음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다진 한국불교는 애초부터 ‘승가의 호국과 국왕의 불교 외호’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국가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됐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신라시대 국왕의 물음에 답한 원광법사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남을 살해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신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사문이 할 짓이 아니지만 대왕의 국토에서 살면서 수초를 먹고 사는 이상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을 직접 목격한 義寂(681~?) 스님은『大乘涅槃經』권3「金剛身品」의 내용을 근거로 정법수호의 명분 아래 전쟁을 용인했다. 출가자로서 할 일은 아니지만 왕권국가에 사는 한 현실적으로 전쟁 용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신라 경덕왕 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살생하면 안 되지만 싸움을 조복하고, 중지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일을 맡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한 太賢(?~?) 스님의 생각도 대동소이하다. 이는 삼국통일 전쟁을 전개한 신라의 세속왕권과 타협한 승단의 교리적 합리화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한국의 불교는 처음부터 왕권의 승인으로 공인됐고, 그리고 흥국, 흥복의 이상으로 받들어져 절대적으로 권력의 비호를 받아 왔기 때문에 국가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국가권력과 타협한 승가의 이론가들은 살생에 대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재가신도들에게는 ‘호법을 위한 호국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대형 사찰들은 사찰 소유의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지키기 위해 三寶淨財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승려들 스스로 무기를 들었고, 속인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찰방위대를 편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승려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살생이 불가피한 전쟁에 승려들이 직접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거란의 침입이 계기가 됐다. 불교가 국가의 법률체제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 승려들도 국법을 지켜야 했던 상황에서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한 국가의 부름에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1010년 제2차 거란 침공 시 法言(?~1010) 스님이 智蔡文(?~1026) 장군의 승병 동원령에 응해 대거란전에 참여해 적병 3,000명을 사살한 바 있다. 이것이 한국불교사에서 국가의 요청으로 승병이 조직되고, 승려가 직접 전쟁에 참전한 첫 번째 사례였다.
1104년 윤관(?~1111)의 여진 정벌시 승려와 그 부속 사람들로 구성된 항마군은 별무반의 한 축으로 편성된 바 있다. 승병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1135년 묘청(?~1135)의 난 진압에 나선 김부식(1075~1151)의 군대에 대항해 승려의 전쟁참여가 빈번해졌다. 승려의 전쟁 참여가 필요해짐에 따라 그들의 전쟁참여가 당연지사로 인식된 것은 거란군이 몽골군에 쫓겨 한반도로 공격해 들어온 고려말에 이르러서다. 당시 승려들은 자신이 속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관군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 일이 흔했다. 1232년 몽골 적장 살리타이(Salietai, ?~1232)를 활로 사살한 김윤후(?~?)는 승려 출신 장수였다.
승려의 전쟁참여가 본격화되고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은 1592년 왜군에 금수강산의 전토가 유린된 임진왜란 때에 이르러서였다. 우리에게 서산대사로 잘 알려져 있는 休靜(1520~1604)은 선조의 어명을 받들어 ‘八道十六宗都摠攝’이라는 직책으로 전국의 승방에 격문을 보내 호국전쟁에 참여하기를 촉구했고, 이에 응해 각 사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승려들을 중심으로 ‘義僧軍’을 조직해 왜군에 대항했다.

이 시기 국가를 위해 종군한 승려는 休靜 외에도 사명당 대사인 惟政(1544~1610), 靈圭(?~1592), 義嚴(?~?), 法堅(1552~1634), 義能, 三惠, 天佑, 一諄 등 숱하게 많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관군과 합동으로 전쟁에 참여해 왜군의 목을 베거나 사로잡아 큰 공을 세웠다. 선조는 적의 목을 벤 승려들에게 포상차원에서 승과급제증을 수여했는데, 유정에게는 禪敎兩宗判事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3품 이상의 당상관에 올려 주기도 했다.
조선의 의승군이 적에 대한 살생의 과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호하려고 한 호국의 대상은 백성을 뒤로 하고 일신만 살고자 중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의주로 도망친 왕과 그 조정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침략군의 말발굽과 총포 앞에 죽어가는 백성, 즉 중생과 불국정토의 삼천리강산이었다. 흔히 한국불교를 천재지변이나 외침에 대항해 국가와 백성을 보호한다는 개념의 호국불교로 성격을 규정짓는데, 이것이 불교인에게나 일반인에게나 모두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까닭도 이 같은 역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호국불교는 ‘호국’의 기능만 강조됐지 종교로서의 ‘불교’의 역할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중생을 돌보는 일보다 국사와 관련된 일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시작되면서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호국불교는 하나의 통치이념의 수단으로 변화를 겪는데, 반공을 선전하고 체제를 다지는 도구로 이용당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시기 임진왜란 시 승군을 이끌고 국난을 극복하는데 영웅적 역할을 다한 서산대사와 사명당대사가 애국애족과 반공의 이상적인 모델로 캐스팅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승려들은 당연히 불교의 첫째 계율인 불살생계와 상관없이 군대에 가야 했다.

불교는 특정 국가와 민족을 뛰어 넘어 사해동포를 아우르는 세계성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는 왕권과 국가권력자들의 권력 유지 차원에 머물렀다. 이제 한국불교는 중생개념의 ‘민’과 불국토 개념의 ‘국’과의 관계에서 호국이 성립돼야 하고, 이 두 개념이 상생하는 호국불교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호국불교란 한마디로 정법수호의 호법사상으로서 호국의 ‘국’이 왕이나 권력의 통치자가 아니라 중생이 함께 하는 터전으로서 다 함께 共業중생으로 불국토 건설에 힘쓰게 하는 불교여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고, 나아가 한민족 전체를 공멸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기도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에서 전쟁의 발생과 국가안보의 위협은 종교적 호오와 믿음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국가의 존속은 물론 종교의 존립마저 허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기독교도에게 국가와 사회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처요, 불교도에게 그것은 해탈에 이르기 위한 수행처이자 뭇중생의 거주처다. 불교가 국가안보를 위한 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 경우 그것은 침략과 정복이 아닌 정법의 통치와 덕치를 이루기 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선봉에 서는 군대를 가리킨다. 그래서 군의 존재의의가 국토방위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 우리가 이룩한 민주헌정의 체제까지 수호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교정법의 군대는 외침시에 전쟁수행의 기능을 다함은 물론 평화시에도 전쟁 대비차원의 국가방위와 함께 정법 실천의 대사회적인 外化로 나타나는 불국토 건설을 위한 대국민 복리증진과 대민지원, 질서의 유지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국방이 불교도에게도 국민의 신성한 의무가 돼야 하는 소이연이다.
병역의무에는 빈부귀천,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해야 한다는 면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선 안 된다. 그러나 불교의 승려나 기독교의 사제, 목회자들은 각기 부처님의 불살생계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비전투 분야에서 종교의 가르침으로 군의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정신건강 진작에 헌신할 수 있는 복무가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인간이라면 자신만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이웃과 주변 상태를 허물거나 방해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 칸트철학에서도 그렇지만, 유교철학의 경전인 논어에서도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자신의 화평을 위해 남을 해하고 침략전쟁을 일으킨 게 인간 역사의 한 면이었다. 인류가 평화를 지향하는 共業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역사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항존한다. 이것은 세계를 반목과 혼돈으로 몰아넣는 현실적 요인이다.
共業의 실천은 명말의 유학자 육세의(陸世儀, 1610~1672)의 생각처럼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전쟁은 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므로 부득이 그를 죽여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이 일은 크게 어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兵陣, 仁人之事也, 不仁之人爲民害, 不得已而殺人以生人, 此非大仁人不可). 이 가운데 “그를 죽여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대목은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죽여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사회의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한 힘을 제어해야 하고,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불교인도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과 구원을 희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깨달음과 구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군사논단』, 통권 제60호(2009년 겨울호, 12월 24일)에 실려 있습니다.
'앎의 공유 > 주요 언론 게재 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도의 과거, 현재, 미래 : 일본은 왜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가? (0) | 2012.03.31 |
|---|---|
| International Significance of the Korean War and Implications for the Present by Suh Sang-mun (0) | 2012.03.31 |
| 세계가 외면한 외로운 투쟁 : 티베트 독립운동 50년사 (0) | 2012.03.30 |
| ‘5․4’와 ‘6․4’, 그리고 중국의 미래 (0) | 2012.03.30 |
| 대만불교의 역사 : 저잣거리를 밝히는 청정 승가의 빛 (0) | 201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