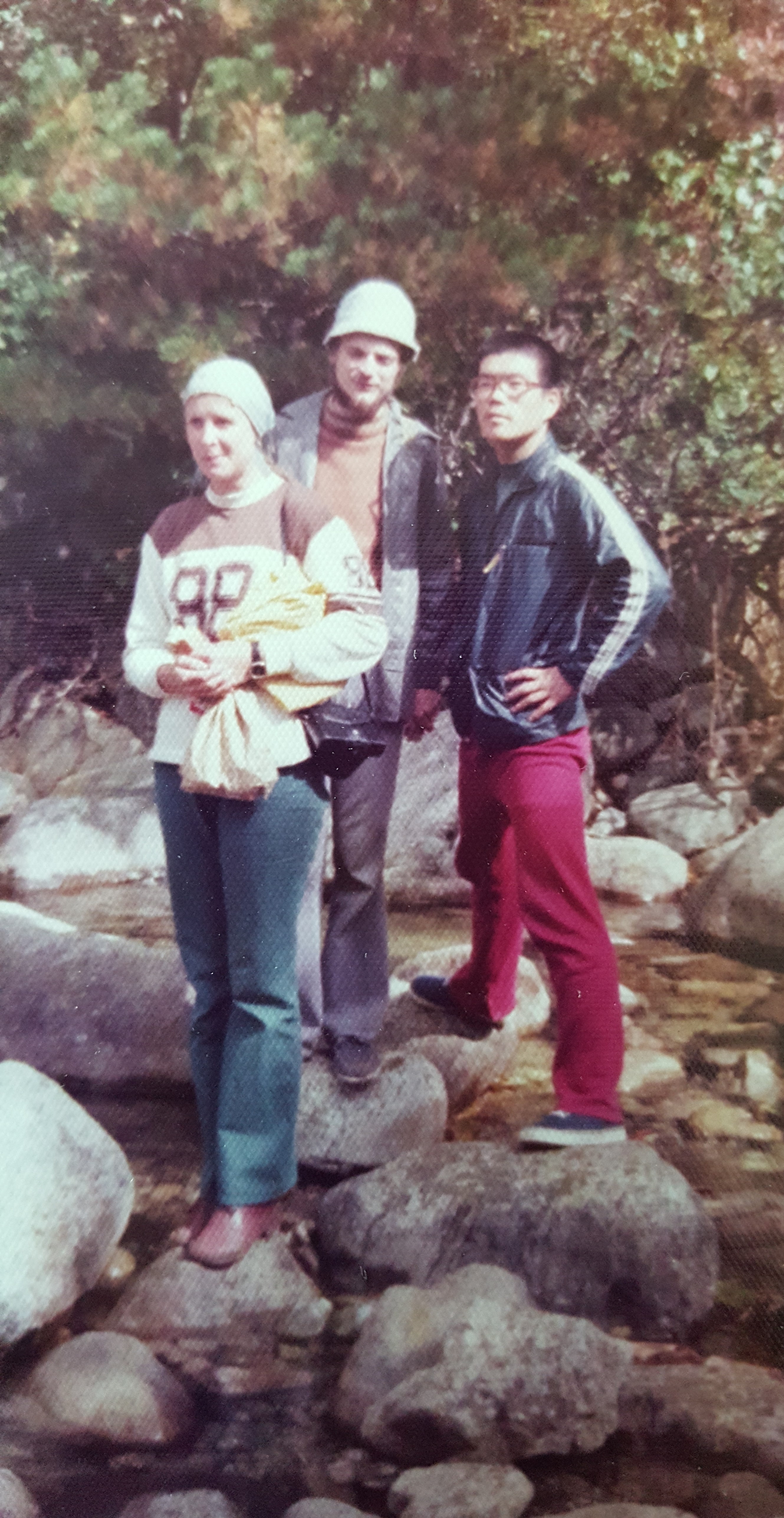詩와 散文 사이 : 박복한 삶, 그래도 고맙다!
詩와 散文 사이 : 박복한 삶, 그래도 고맙다!
세상 어디를 다녀 봐도, 누구를 만나 봐도
나만큼 때 묻지 않은 사람 흔치 않고,
나만큼 마음 비우고 사는 사람 보지 못했다네.
출세하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본 바 없고
이익을 쫓거나 기회를 잡으려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 적 없었네.
감투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 쓰라는 감투 마다 한 게 여러 자리였고,
자리에 연연해하지도 않았으며,
부러질지언정 의롭지 않는 일에 낭창낭창 휘감긴 적도 없었네.
나만큼 세상 욕심 내지 않고,
나만큼 보이지 않게 상대를 배려하며 사는 사람도 드물더라.
무슨 상 하나 받으려고 꼼수 부릴 생각은 애시 당초 없었다네.
남들이 출세하고 힘 있고 돈 자랑하는 친구 쫓아다닐 때
나는 못 배우고 힘없고 못 사는 친구 찾아가 같이 술 마셨지.
제 입에 딱 맞는 떡이 어디에 있을까만
천하에 친구들이 그리 많아도 나만한 친구도 많지 않더라.
유년시절
동생 업고 장사 간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찾으러 집 나섰다가
집에 돌아가지 않은 가출이 너댓 번, 그게 너댓 살 때였어
사람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게 천성이었더구만
나중에 커면서는 그게 친구에게 쏠렸던 모양이더라.
소싯적 초등, 중학생 시절엔 친구가 좋아 아예 친구집에서 살다시피 했었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서울, 부산 대도시든, 하남, 옥천 시골 골짜기든
고향 떠난 친구가 보고 싶어 불원천리 마다 않고 찾아가곤 했었지.
심지어 군대 들어가 이등병 시절부터 상병 달고, 병장 달고 휴가 나와서까지
친구, 선후배 근무하는 부대로 면회 간 게 한 두 사람이 아니었다네.
그게 어느 정도는 타고난 건데 대학에 들어갔다고 달라지겠나
고향친구, 술친구, 공부친구, 그림친구, 주먹친구, 군대친구, 사회친구 수백 명이었지.
보너스가 1100프로나 되던 첫 직장 잡은 뒤로
회사 앞에서 내가 퇴근하길 기다린 친구들이 사흘 건너 한 팀이었다네.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늘 친구 안부 묻고 사는 친구도 드물더라.
볼 일 보러 가더라도 짬 내어 그곳 지인 얼굴 보고 오는 게 다반사였어
서른이 넘어 남들이 부러워한 직장을 그만두고 결행한 유학길
해외에서 뼈 빠지게 ‘노가다’하고 보따리 장사하면서 홀로 공부하느라
여유라곤 개미 눈썹만큼 없이 살아도 한 동안은 국내친구들 안부 묻는답시고
연말이면 연하장 꼬박꼬박 보내면서 살았네.
산다는 게 부평초 같고, 구름 같아 죽고 나면 한 줌 재라
20대에 안구기증 약속해놓은 몸이라 육신도 아깝지 않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이라
까짓거 잠시 손에 든 재물이 아까울 게 뭐가 있나 싶어
부도난 친구에게 재기하라고 땅 팔아 거금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었지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배신이었네.
변제는커녕 종적을 감추고 이날 이때까지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더라.
크게 베푼 건 없어도 써야 할 때 외면하지 않고 살았다네
두 번째 직장 잡고선 술사고 밥 사는데 단 한 번도 인색한 적 없었네
공무원 월급이지만 도움을 호소한 사람에게 거절한 적 없었고,
남들 다 하는 기부도 여기저기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해외 아동들 결연 맺어 지원도 십수년 해왔으며,
써야 할 땐 과감하게 내 형편 돌보지 않고 거금을 내지르기도 했네.
때로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내 말에 힘을 얻어 인생이 바뀐 이들도 제법 되고,
베풀지는 못해도 빚은 지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다보니
배고플 때 우유 한 통이라도 베푼 이에겐 강산이 변해도 잊지 않고 필히 되갚았고,
도움 준 이들에게 혹여 갚는 게 미진하면
돌고 도는 게 돈이라 나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았지만,
늘 먹는 밥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만, 이날 이 때까지 밥 한 번 사지 않고
술 한 잔 사지 않는 친구도 있더구나.
바빠서 손오공처럼 분신이 필요할 정도였어도,
일에 지쳐 혼곤히 자다가도 친구가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큰일이건 작은 일이든 귀찮다 생각 않고 낮밤 가리지 않고 응했건만
정작 내가 작은 도움을 청했을 땐 애오라지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친구는 드물더라.
술자리에서 이 친구, 저 친구 하는 온갖 얘기 다 들어주며 산 게 20여년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고 바탕 없이 말해도
세상 보는 눈이 어찌 다 같겠냐 싶어 이코저코 입대지 않았지만,
정작 내가 하고픈 얘길 할라치면 골치 아픈 얘기라며 손사래 치더라.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지도자의 혼용무도나 실정을 비판한다고 해서
나를 빨갱이로 생각하는 친구들까지 있더란다.
심지어는 내가 정치할 거라는 소문이 나돈 뒤로는
면식 없던 사람도 내가 자기 상전과 경쟁된다 싶어 멀리하지를 않나
공무원이면서도 공무는 뒷전에 두고 선거 운동하러 다니는 주제에
뒤에서 험담까지 하는 이도 있더라.
반백년이 더 지난 지금도 친구를 찾아다니지만
옛 시절 내가 친구들 찾아다니던 일을 잊지 않고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더라.
나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많은 추억으로 먹고 살지만,
그 추억으로 돈 없이도 부자가 돼 있지만,
정작 찾고 찾았던 그 친구들은 잊고 살더라.
외려 학창시절 자기는 공부 잘 했고,
나는 정학 먹고 학교 짤린 문제아였다는 기억만 하고
괜히 나를 경원시하고 멀리하는 동기들도 있더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에 사람을 그 시절 3년에 가둬놓고 보더라.
한 때 뒤쳐졌다가도 분발하면 바뀌는 게 그게 인생묘미 아니더냐.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는 인생에서 잠시 앞선 게 그리 좋던가베
반평생 이상 살면서 꼭히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 거지만
고백컨대 나도 필경은 부족하고 고만고만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서
나도 감정 있는 인간인지라 때로 야속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지 않아서
간혹 도가 지나친 선후배나 친구를 책망한 일도 있지만,
그게 기분 나쁘다고, 그게 자존심 상한다고
자신이 나에게 행한 어이없는 잘못은 한 치도 되돌아보지 않고
의붓자식 버리기로 작정한 계모마냥
인연 다한 듯이 어느 날 연락 뚝 끊어버리더라.
아직도 이용할 때만 연락하는 이도 있는가하면,
인맥을 만든다는 생각에 인맥관리로 만나려는 이도 있더구나.
세월이 또 한 뼘 건너뛰듯 지나고 있지만
박복한 게 다 내 탓이려니 하고 산다.
다 덕이 없어 그런 게 아닌가 여기며 산다.
타고난 복이 그것뿐이려니 하고 산다.
섭섭한 거 다 털어버리려고 의식하며 산다.
그리 살지 않으면 “우짤낀데?” 하고 산다.
지금도 내가 상록수인 걸로 착각하면서 산다.
약자와 된 자와는 쉽게 친구가 되지만,
자존심은 남아 있어 無道한 자에게는 함부로 머리 숙이지 않지만,
어려워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고지식하게 홀로 꾸려가며 살지만,
인생 종치는 날까지 페르소나(persona)로 살란다.
이 순간에도 이승에서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 무탈하게 잘 살기를 빌어본다.
2017. 3. 10. 07:45
고향에서
雲靜